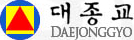소개
대종교(大倧敎)는 삼신일체(三神一體) ‘한얼님(하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단군한배검을 교조(敎祖)로 받드는 한국 고유의 종교다.
대종교의 대종(大倧)은 천신(天神, 하느님)이란 뜻이다. ‘대(大)’는 ‘천(天)’에 속하며 우리말로 ‘한’이다. ‘종(倧)’은 신인 종자(字)로 순우리말로 ‘검 또는 ‘얼’로 표현할 수 있다. 한얼님이 사람으로 변화해서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신인(神人)이다. 한얼님이 지상에 내려오심은 세상을 크게 널리 구제(弘益人間 理化世界)하기 위한 것이다. ‘대종(大倧)’에는 이러한 진종대도(眞倧大道, 한얼 이치의 진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
대종교의 구현목표는 진종대도 곧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이며, 그 교리는 민족의 정통사상과 철학을 담았다. 홍익인간은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조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범세계적 종교성을 띄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대종교의 교사(敎史)는 우리 역사와 같다.
《삼국유사》에는 환웅께서 이 세상을 홍익인간하시기 위해 천부삼인(天符三印)을 가지고 삼선사령(三仙四靈)을 거느리고 백두천산 신단수(神檀樹) 아래 강림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곡식·명령·질병·형벌 그리고 선악의 3백60여가지 일을 주재하며 이화세계(理化世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교정일치(敎政一致)의 정사(政事)와 교화(敎化)의 대 역사이며 특히 다섯 가지 일(五事)중에 선악을 주관해 종교적 교화의 바탕을 이루었다. 삼선사령이란 토지를 맡은 팽우(彭虞)와 글을 맡은 신지(神誌)와 농사를 맡은 고시(高矢) 등 세 선관과 풍백(風伯)· 우사(雨師)·뇌공(雷公)·운사(雲師)등 네 신령을 말한다.
따라서 대종교의 역사는 한웅천왕(桓雄天王)이 사람으로 변화하여(以神化人) 백두산에 내려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때는 상원갑자(上元甲子, BC2457)년 10월 3일이다. 신인(神人)이 우매한 백성들을 교화하자 삼천단부(三千團部) 백성들이 모두 모여 신인을 임금으로 추대하니 광대한 통일대국이 이뤄졌다. 이 때가 상원갑자년에서 두돐갑자 지난 무진년 (再周甲子 戊辰年, BC2333) 10월 3일, 바로 단군원년이다.
![]() 우리 나라에 현묘한 도(玄妙之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도라 이른다. 이 교의 유래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실로 도교·불교·유교 등 3교(三敎)를 다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우리 나라에 현묘한 도(玄妙之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도라 이른다. 이 교의 유래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실로 도교·불교·유교 등 3교(三敎)를 다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신라 때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은 ‘난랑비서문[鸞郞碑序]에서 고유 종교인 신교(神敎)를 이처럼 조화와 융합의 원리를 지닌 종교로 기록했다. 풍류도는 고래(古來)로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을 바탕으로 도맥(道脈)을 모두 간직한 것이다. 그것은 유·불·선 삼교가 통합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교 이전부터 그 기본 교리를 포괄했다.
대종교의 교맥(敎脈)은 단군조선 시대에 신교(神敎), 부여에서 대천교(代天敎), 고구려에서 경천교(敬天敎), 신라에서 숭천교(崇天敎), 백제에서 수두(蘇塗), 발해에서 진종교(眞倧敎)로 이어졌다. 또 고려 때는 왕검교(王儉敎), 만주에서는 주신교(主神敎), 다른 곳에서는 신교(神敎) 또는 천신교라고도 하였다. 역대로 교명(敎名)을 달리하면서도 그 교맥은 하나로 계승되다 근세에 와서 대종교(大倧敎)로 중광(重光·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암흑기도 거쳤다. 고려 중엽 원종 때 몽골의 침입으로 교문이 닫힌 것이다. 그 뒤로 줄곧 외세에 몰려 주체성을 살리지 못했지만 그 의식(儀式)은 7백여년 동안 민속화한 형태로나마 잔영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조선 말 백봉 등 13인의 백두산 도인은 국운이 기우는 지경에 이르자 1904년 음력 10월 3일 백두산에서 대종교를 포명하였다. 그 뒤 우국지사였던 홍암 나철에게 도맥을 전해 구국제민(救國濟民)을 위한 중광을 재선포했다. 때는 1909년 음력 1월 15일이다.
대종교 경전(經典)《삼일신고(三一神誥)》에는 지감(止感)·조식(調息)·금촉(禁觸)이라는 3법이 있다. 불교의 명심견성(明心見性)하는 참선법(參禪法)은 바로 지감법에서 유래한 것이며, 도교의양기연성(養氣煉性)의 도인법은 조식법, 유교의 수신솔성(修身率性)하는 극기수양법(克己修養法)은 금촉법에서 유래했다. 이 3법을 함께 수행하여 통달하는 것이 바로 대종교의 수행법인 삼법수행이다. 대종교는 유·불·선 3교의 종지(宗旨)를 다 포괄하는 셈이다.
대종교의 신관(神觀)은 조화(造化)·교화(敎化)·치화(治化)의 3대 권능을 두루 갖춘 삼신일체(三神一體) 한얼님을 주체(主體)로, 모든 종교를 작용(作用)으로 포함해 모든 종교의 모체이자 근원이라고 본다.
예로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삼신(三神)이 점지해 생겼다고 한다. 여기서 삼신이란 세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화·교화·치화의 삼신작용을 가진 절대주께서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다. 대종교 교리 자체도 삼신일체에서 기인한 삼일원리로 이뤄졌다고 풀이된다.
《삼일신고》‘진리훈’(眞理訓)에는 사람들은 세 가지 참함(三眞), 즉 성품(性)과 목숨(命)과 정기(精)를 한얼님으로부터 점지 받는다고 나온다.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 세 가달(三妄), 즉 마음(心)·기운(氣)·몸(身)에 끌리어 선악(善惡)·청탁(淸濁)·후박(厚薄)함이 생겨난다. 결국 이 세 가달을 세 참함으로 돌이키면 참사람이 되고(返妄卽眞), 다시 참함을 위로 돌이키면 한얼님과 같이한다(返眞一神, 神人合一)는 것이다. 결국 삼일(三一) 교리는, 주체는 하나지만 세 작용으로 나뉘고 작용인 셋은 다시 하나인 근본으로 환원한다는 이치다(三眞歸一, 卽三卽一). 이것이 우리 민족 사상 가운데 흐르는 삼일(三一) 철학의 맥락이다.
대종교의 삼일 철학은, 하나가 곧 무한대이듯 천상과 지상이 같고 하늘과 인간이 같아 천·지·인(天地人) 삼극(三極)을 하나로 동일시한다. 인간을 하늘과 같은 소우주로 보며, 인간은 한얼님의 자손(天孫)이요, 하늘의 백성(天民)임을 깨우치며 한얼을 공경하고(敬天), 조상을 받들어 모시며(崇祖), 이웃과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愛人)하는 것을 한얼의 윤리(天倫)로 삼으며 충효(忠孝)사상을 키운다.
이러한 사상이 일제 강점기에는 대종교를 항일 독립투쟁으로 일관한 종단으로 만들었고, 36년 간 무려 10만여 명의 순교자를 낸 바탕이 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대종교가 전생(前生)과 현생(現生)과 후생(後生)을 영원히 하나로 보는 것은 모든 인류 종교의 바탕을 가진 종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이며《25시》의 작가인 게오르규(1916∼1992)는 한 칼럼에서 홍익이념을 언급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정치·경제지인 <라 프레스 프랑세스>(1986.4.18일자)에 실린 ‘다시 일어나는 한국’이라는 글에서였다.
17세기만 해도 유럽인들은 한국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유럽으로 돌아온 하멜(1692·네덜란드 선원) 일행은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민족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후로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한국은 매년 10월3일이면 개천절을 기념한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지극히 평화적이고 근면한 국가다. 단군은 개국과 함께 그 국민에게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과 농사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구텐베르크(1398∼1468)보다 2세기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단군의 통치이념은 지구상의 법률 중 가장 강렬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법률이다. 그들은 예술을 사랑하고, 그 나라 옛날 여인들은 왕녀와 같이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으며 전통사상을 지켜왔다…(중략). 한국인은 세계적 대륙의 거대한 공사장에 진출, 단군의 이념인 홍익인간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처럼 홍익인간의 참뜻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크고 널리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인류 구제와 지상천국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인류복지사상이며 천리(天理)에 의해 국가사회가 영위되는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결국 ‘홍익주의’는 박애요, 자비요, 인애(仁愛)사상이다. 편협한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한 사랑이 아니라 실로 크고 넓은 진정한 인류애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다 포용하여 화합협동하는 보편타당한 조화원리다. 인류 최고의 이상향을 뜻하는 것이 대종교의 구현목표인 것이다.
단군 한배검은 국조로서 배달민족의 조상이며 민족의 주체와 구심체가 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단군 숭배사상은 유구한 역사민족의 표상이며 우리 자체의 생명과 본성의 원천인 것이다.
대종교는 단군한배검을 교조로 받들고, 민족 고유신앙의 뿌리로 섬긴다. 신선(神仙)사상과 국조숭배사상과 천부(天父)사상은 일맥상통하는 원리로써 우리는 천손(天孫)·천민(天民)인 셈이다. 전세계에서 천손·천민으로 자처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유태인들은 선민(選民)임을 자처한다. 단군한배검은 개국 이래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국난 극복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대종교의 홍익인간 이념과 만유(萬有)사상과 원리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교리와 사상·철학 그리고 만고에 빛나는 불멸의 공덕은 너무나 거대하고 높아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다.
대종교 삼일(三一)철학이란? 모든 종교 포용하는 공존 · 평화의 논리
대종교의 종교사상과 철학은 우리 민족사와 함께 이어져온 삼신일체원리(三神一體原理)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속에 뿌리내린 삼신상제(三神上帝)나 ‘삼신할머니’로 일컬어지는 삼신일체의 한얼님을 말한다.
- 삼신일체신관
- 세검한몸이신 하느님으로 우주가 생성하기 전부터 더 위가 없는 으뜸자리에 있으면서 우주를 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조화신(造化神)으로 한임(한님)이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는 만백성을 가르쳐 깨우친 교화신(敎化神)으로 한웅님이요, 만물과 백성을 기르고 다스리신 치화신(治化神)으로 한검님이다. 이 세검(三神)은 한몸이신 한얼님(하느님)이 된다.
- 체용(體用)관계
- 한얼님은 주체가 되고, 한임과 한웅과 한검은 주체의 작용이 되는 관계다. 한얼님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한얼님은 주체다. 한얼님으로 백두산에 내려온 것은 보이지 않는 한얼님의 작용자리로 온 것이다. 결국 한임(한인)과 한웅과 한검은 하나인 한얼님의 두 가지 표현이다.
- 3대작용(三大作用)
- 하느님의 세자리인 한임·한웅·한검은《삼일신고(三一神誥)》의 ‘신훈’(神訓)에서 말한 한얼님의 3대작용인 큰 덕(사랑)과 큰 슬기와 큰 힘은 ‘한’(一)의 기원점이 된다.
한얼님은 큰사랑(大德)이 있어 우주와 만물을 낳으시므로, 한얼님은 아버지이신 임(因=옛말의 父)이 되시고 큰 슬기(大慧)가 있어 만물을 화육하므로 스승이신 웅(雄=옛말의 師)이 되고, 큰 능력(大力)이 있어 우주와 만물을 완성하시므로 임금이신 검(儉=옛말의 帝)이 되시는 세 가지 자리 쓰임(用)이 있어 삼신일체 한얼님이라고 한다.
- 하느님의 세자리인 한임·한웅·한검은《삼일신고(三一神誥)》의 ‘신훈’(神訓)에서 말한 한얼님의 3대작용인 큰 덕(사랑)과 큰 슬기와 큰 힘은 ‘한’(一)의 기원점이 된다.
- 한은 우주의 본체
- 이에 한임·한웅·한검은 한의 임과 한의 웅, 한의 검이라는 말이므로 “한은 임·웅·검의 주체요 임·웅·검은 한의 작용이니 체(體)·용(用)의 관계가 된다. 이로써 ‘한’은 우주의 본체요, 진리체요, 원인자임을 알 수 있다. 한님·한얼님·하느님·한울님·하나님이라는 말들은 한을 인격화해 부르는 하나의 존칭이다.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로서 가장 위대한 말이다.
이처럼 한은 인간성, 민족성, 지역성 같은 특수성이 전혀 섞이지 않은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우주의 본체요, 유일무이한 우주신이다. 그러므로 삼신일체 신은 ‘한’을 의미하고 한(一)은 수(數)의 시작으로서 본원적, 근원적인 의미를 지닌다. 삼신일체는 곧 천일(天一)·지일(地一)·인일(人一)의 일체다. 한을 인격의 의미로 보면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 즉 천인합일신인(天人合一神人)사상이다.
삼신일체는 3원론으로서 조화(調和)사상이다. 민족경전인《천부경(天符經)》에 ‘하나는 처음인데 처음이 없는 것도 하나요, 하나가 발동하면 만번 가고 만번 오며 하나는 끝인데 끝이 없는 것도 하나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一)은 극대(極大)요, 처음이요, 끝이요, 처음도 끝도 없는 무한이라는 뜻이다.
하나와 전체가 같고, 작은 하나가 큰 무한과 같다는 인식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원리는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모두 한으로 표현하며 상반되는 것도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면서 일치 통일하는 논리다. 이것이 하나는 셋으로 작용하며(卽一卽三) 작용인 셋은 하나인 본체로 환원(還元) 발전한다. 즉일즉삼은 이치다.
이것이 삼일철학이며 삼일논리인 한철학이다. 삼일논리에 의하면 하나가 곧 무한대(無限大)이듯 천상과 지상이 같고 신과 인간이 같으므로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삼극(三極)을 같이 본다.
대개 하늘나라를 인정하는 민족은 땅을 죄악시하기 쉽고 하느님을 성스럽게 보고 사람을 죄인으로 보거나 천하게 본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은 하늘나라를 인정하면서도 홍익인간의 지상천국도 인정하고 동일시하였다.
삼일신고 진리훈에 가달을 돌이켜 참으로 나아가면 참사람인 성철(聖哲)이 되고, 다시 세참함을 하나로 돌이키면 한얼님이 같이한다. 곧, 반망즉진(返妄卽眞)하고, 반진일신(反眞一神)한다고 밝혔다.
사람이 한얼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사람과 한얼을 똑같이 보는 신인합일(神人合一) 신인일여(神人一如)의 원리요, 논리다.
서구에서 발전한 변증법은 정반합(正反合)이란 부정(不定)의 과정을 통한 종합의 논리지만 삼일철학의 논리는 상호 긍정의 과정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종합이 아닌 환원(還元)이다. 즉, 정반합인 긍정·부정·종합의 과정이 아닌 정·정·원(正正元)의 긍정, 즉 긍정환원의 논리인 것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부정의 논리인 변증법으로 많은 갈등과 고난을 겪어왔다. 자기와 자기가 아닌 사람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부정 논리는 생존경쟁에서 상쟁과 상극의 현상을 합리화하고 침략과 전쟁을 불러왔다. 또 이 부정의 논리는 모든 것을 분열쪽으로 몰고 가 모든 현상을 상호 반대적인 것으로 규정지어 배타적인 행동을 조장했다.
이에 반해 한사상의 삼일논리는 긍정하고 포괄하고 모든 것을 협동 조화시켜 본래의 뿌리인 하나로 일치시키고 통일시키는 원리다. 결국 본래가 상반되는 존재는 없고 서로 모여 완성체(完成體)를 이루며 서로 배타심이나 갈등 같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이 원리와 논리야말로 상쟁과 상극의 역사를 통일 지양하여 상생(相生)의 평화와 세계역사를 이룰 수 있다.
開天節과 御天節은? 죽음 추월한 신선사상
개천절은 한 옛날(上元甲子) 상달상날(10월 3일)에 단군 한배검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건설하시고자 하늘의 문을 열고 백두산에 강림한 날이다.
개천절은 예로부터 상달상날(上月上日)이라 높여 불렀다. 이날을 기려 거족적인 제천의식이 계승, 전래했다. 옛 부여에서는 영고(迎鼓), ‘예’와 ‘맥’에서는 무천(舞天), 마한·변한은 계음(契飮), 고구려는 동맹(東盟), 백제는 교천(郊天), 고려에서는 팔관회(八關會)라는 민족제천 대회를 봉행했다.
이를 통해 국민 대단합과 경천숭조(敬天崇祖)·충효사상 등 민족 고유의 정통윤리를 확립하고 근본을 갚는 예절을 전수해온 것이다. 그러나 고려 중엽 외래문물의 유입과 몽고의 침략으로 이러한 거족적인 민족의식은 흐려지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종교의식은 민속 및 민간신앙으로 숨어 들어갔다.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에는 고삿날로 그 잔영을 겨우 유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7백여년동안의 암흑기를 거쳐 결국 우리는 나라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홍암 대종사는 대종교의 중광과 함께 민족 고유의 천제의식을 되살렸다. 뿌리를 찾아 정통신앙으로 국조 단군 한배검에게 귀일(歸一)하는 길만이 겨레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구국일념에서였다.
4252년(서기 1919)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음력 10월3일을 개천절로 정해 해마다 대종교와 함께 경축했다. 일제가 패망하자 4281년(서기 1948) 8월15일 국내에서 새 정부가 수립되면서 개천절을 거듭 국경일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 4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제헌절, 광복절은 일제로 인하여 생겼지만 오직 개천절만이 우리 민족의 정통 명절로 이어진 것이다.
개천절과 함께 어천절(御天節) 또한 대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어천절은 단군 한배검께서 고조선(배달국)을 세워 홍익인간 이화세계 실현의 기틀을 잡아 주시고 ‘아사달’에서 다시‘한얼’의 본 자리로 되돌아 가셨다는 사실을 기리는 날이다. 우리의 어천절은 외래종교의 부활절과 비교되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활은 죽었다가 사흘만에 되살아났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어천은 죽지 않고 산 그대로 신선이 되어 갔다고 하는 사상이다. 이 신선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으로 죽음 자체가 없다.
- 신선사상은 죽음을 초월
-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군자불사지국(君子不死之國), 죽지 않는 군자의 나라로 부른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삼국유사》 등 문헌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최치원 같은 선인(仙人)들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 《해동이적(海東異蹟)》《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 등에서도 육신을 지닌 채 승천한 사람, 갓과 신발을 관속에 두고 승천했거나 빈 관을 남긴 채 홀연히 승천한 사람 등의 기록이 나온다. 모두 신선사상의 맥을 짚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어천이란. 하늘을 타고 간다는 뜻이다. 한얼(하늘)에서 왔으니 한얼의 본 자리로 되돌아 간다는 귀천(歸天)사상이다.
신선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긴 하되 도를 완성하여 사람으로서의 본래의 자리를 찾은 사람을 일컫는다고 본다. 도(道) 자체엔 어떤 형체나, 제약이나 대립 조차 없다. 도를 이루면 자유자재 하게 되는 것이 우리민족의 고유 신선사상이다.
-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군자불사지국(君子不死之國), 죽지 않는 군자의 나라로 부른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삼국유사》 등 문헌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최치원 같은 선인(仙人)들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 《해동이적(海東異蹟)》《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 등에서도 육신을 지닌 채 승천한 사람, 갓과 신발을 관속에 두고 승천했거나 빈 관을 남긴 채 홀연히 승천한 사람 등의 기록이 나온다. 모두 신선사상의 맥을 짚게 하는 내용이다.
- 민족의 얼로 조국 통일의 원동력 되게
- 《삼일신고》에서는 신선사상의 원리인 성(性)·명(命)·정(精)을 말해 놓았다. 간단히 말하면 성은 마음을 낳고, 명은 기를 낳고, 정은 육신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신선이 되어 감은 육신이 다시 정으로 돌아가는 원리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수(壽)를 다하면 ‘죽었다’는 표현보다 ‘돌아가셨다’는 말로 추모한다. 이 말 뿌리 역시 선어(仙語)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천사상, 곧 신선사상은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사상이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다물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외래사상의 난무속에 자아를 상실해 가는 요즘, 개천절이 민족 중흥의 날이 되고 이 사상이 민족의 얼로 뜨겁게 용솟음쳐 국난 극복과 조국 통일의 힘찬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 《삼일신고》에서는 신선사상의 원리인 성(性)·명(命)·정(精)을 말해 놓았다. 간단히 말하면 성은 마음을 낳고, 명은 기를 낳고, 정은 육신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신선이 되어 감은 육신이 다시 정으로 돌아가는 원리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수(壽)를 다하면 ‘죽었다’는 표현보다 ‘돌아가셨다’는 말로 추모한다. 이 말 뿌리 역시 선어(仙語)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천사상, 곧 신선사상은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사상이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다물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대종교는 구한말 엘리트 계층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대종교는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린 한반도에서 조선의 주권과 독립을 열망하는 지식인들을 민족정신으로 잇게 한 사상적 토대이자 실천적 기반이었다. 무오독립선언 초안 마련, 북로군정서·광복군 등 무장 독립운동, 상하이 임시정부 참여, 민족학교 설립, 민족사학의 정립, 한글지키기운동, 해방 후 건국운동에 이르기까지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대종교인들의 화려한 면면.
대종교의 인물들은 대종교의 중광(重光·다시 일으켜 세움) 전과 후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조선조 홍만종은《순오지(旬五志)》에서 신교(神敎·대종교)와 연관된 인맥의 흐름을 단군·혁거세·주몽· 술랑·영랑·안상· 남랑· 옥보고·김렴효· 소하대로·산시· 김가기· 최치원·강감찬· 권진인·김시습· 홍유손·정붕· 정수곤·정희량 등 수십명을 열거했다.
이렇듯 중광 이전 단군신앙과 관계된 인물들도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고찰은 대종교의 역사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해 쉽지 않다. 종교적 방면에서 대종교의 인물들을 꼽으라면 홍암(弘巖) 나철(羅喆) 대종사와 무원·백포·단애(檀崖) 3종사(宗師)를 내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 대종교는 중광 이래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엮인 종리(倧理)·종사(倧史)·교단조직·종무행정 등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대종교의 중광 교조(重光敎祖)인 홍암 대종사는 대종교신앙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한국 종교사의 큰 스승이다. 그는 구한말 장원급제했던 당대의 엘리트로 지(智)·덕(德)·용(勇)을 겸비한 우국지사요, 사상가였다.
그에 의해 주도된 을사5적 주살(誅殺)사건이 궁극적인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나라는 망했어도 민족은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민족정신의 부활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09년 우리 민족 정신사에서 중차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는 대종교 중광을 선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 퇴색하고 짓밟힌 종교·사상·문화를 재건하고 연결해야 한다는 종교사상적 명분과 빼앗긴 주권 아래 몰락한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권적 명분을 동시에 세우게 된다.
- 1) 항일독립군 양성 위해 국사교과서 편찬
- 그는 또《신리대전(神理大全)》을 저술하여 단군신앙의 사상적 틀이라 할 수 있는 삼신일체사상을 철학적으로 구명했다. 또 <중광가(重光歌)>나 <밀유(密諭)>에 나타나는 그의 종교적인 신묘한 통찰과 순수한 정신주의, 나아가 인류를 하나로 끌어안는 홍익주의적 가치는 실로 홍암사상의 위대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더욱이《삼일신고(三一神誥)》<진리훈’(眞理訓)>의 3법(三法)에 나타나는 조식법(調息法)을 통한 폐기(閉氣) 사망은 홍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수행경지를 나타낸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민족사회의 각성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종교 중광 2세 교주를 지낸 무원 김교헌(金敎獻) 종사는 만주를 중심으로 한 교세 확장과 함께 대종교의 전성기를 일궈냈다. 특히 대종교 교사의 시금석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 또한 구한말의 석학으로 1909년 규장각 부제학으로 국조보감(國祖寶鑑) 감인위원(監仁委員)을 역임한 국학의 권위자였다. 그는 1910년 대종교에 입교하고 만주로 망명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 중 1916년 홍암 대종사가 순교하자 교통(敎統)을 전수받고 대종교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종경회(倧經會)를 구성하여 교적(敎籍)의 인쇄·간행을 활성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포교활동 및 교세 확장을 도모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22∼23년 총 46개소의 시교당을 설치하게 된다. 즉 만주지역 34개소, 국내 6개소, 노령지역 3개소, 중국 본토 3개소를 거느리게 된 것이다.
그는 또 1918년 재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결집해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이 선언은 일제에 대한 무장혈전주의 선언으로, 후일 도쿄(東京)유학생들에 의해 발표된 ‘2·8독립선언서’와 ‘3·1독립선언서’의 기폭제가 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여기에 서명한 39인 가운데 몇명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대종교인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김교헌 종사는《신단민사(神檀民史)》와《신단실기(神檀實記)》그리고《배달족역사(倍達族歷史)》를 저술해 신교[大倧敎]의 역사를 체계화하고 민족사관의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한다.《신단실기》의 특징은 한국사를 배달족(檀君族)이라는 단일민족으로 체계화하고 요(遼)·금(金)까지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한 대종교적 역사상을 정립하면서 반도적 역사인식을 대륙으로 넓혔다는 데 있다.《신단민사》는 통사 체계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 교과서용 편찬으로 이 책에서도 역시 대륙사관의 일관성을 드러낸다. 때문에《신단민사》는 대종교뿐만 아니라 당시 항일 독립군을 양성했던 사관학교 학생들에게도 국사 교재로 널리 사용되어 대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항일정신을 일깨우기도 했다.
《배달족역사》또한《신단민사》와 비슷한 통사체계의 구성으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에서 간행하여 국사교과서로 사용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대종교의 종교적 인물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백포 서일(徐一) 종사를 꼽을 수 있다. 백포 종사는 함경북도 경원 태생으로 경술국치 후 동만(東滿)으로 망명하여 대종교에 입교하면서 교리 연구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헌신한 인물이다. 우선 만주지방에서의 본격적인 항일투쟁이 서일이 조직한 중광단(重光團)의 출현과 함께 본격화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중광단은 대종교도들로 뭉쳐진 만주 최초의 항일독립운동 단체로서 ‘중광’의 명칭 또한 민족 고유사상의 부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대종교의 을유(己酉·1909)년 중광에서 그 뜻을 취했다.
후일 이 중광단은 정의단(正義團)으로 확대, 개편되고 나아가 북로군정서로 발전한다. 서일은 뭇동지들의 추대로 북로군정서의 총재로 취임하여 대종교 정신에 입각한 사관 연성소를 설립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독립운동사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청산리 독립전쟁의 승리를 일구어냈다. 백포는 독립군을 지휘·통솔하는 와중에서도 언제나 단주(檀珠)를 목에 걸고 수도생활과 대종교의 종리탐구(倧理探究)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 2) 일제, ‘종교 가장한 항일단체’로 박해
- 이러한 배경에서 백포는 무장독립투쟁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철학사에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한학과 역리(易理)에 능통하고 불서(佛書)와 신학(神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독립투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한 수행과 연구를 통해《회삼경(會三經)》 <삼일신고도해강의(三一神誥圖解講義)>, <신리주해(神理註解)>, <종지강연(宗旨講演)><삼문일답(三問一答)> 등 실로 기적에 가까운 연구업적을 이룩했다.
《회삼경》은 분삼합일(分三合一)의 종리(倧理)를 36종의 묘화대법(妙化大法)으로 귀일하게 한 심오한 경전으로 중광교조 홍암 대종사의 “신리대전》과 쌍벽을 이루는 글로 평가된다. <삼일신고도해강의>는 하느님 교화의 큰 가르침을 신인일리(神人一理)의 경지에서 우주관·내세관·인생관 등을 종교철학적 측면에서 궁구한 것이며 <신리주해>는 삼신(三神)·삼종(三宗)의 동의(同義)와 회삼귀일(會三歸一)의 화행묘법(化行妙法)을 명시하였다.
한편 <종지강연>은 인생의 본능·자유·행복 등을 현대철학사조에 비추어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특히 백포의《구변도설(九變圖說)》·《진리도설(眞理圖說)》은 천·지·인(天地人) 3극(三極)의 원리를 생·화·성(生化成)의 변칙에 의하여 가달(妄)을 돌이켜 참(眞)으로 돌아가는 이치로 명쾌히 밝힌 철리도(哲理圖)이다.
끝으로 대종교의 3세 교주를 지낸 단애 윤세복(尹世復) 종사는 1910년 12월 홍암 대종사와의 짧은 만남에서 큰 감명을 받고, 홍암으로부터 세린(世麟)이라는 본명을 세복으로 개명받음과 함께 단애(檀崖)라는 새로운 호(號)도 받았다. 그 뒤 시교사(施敎師) 자격으로 만주 환런(桓仁)현으로 건너가 동창학교를 설립하고 대종교 정신을 토대로 한 민족교육을 시작한다. 대종교 중광 이후 세 교주 가운데 1924년 교주를 맡아 1950년 4월29일 제7회 교의회를 통해 총전교제로 바뀌기까지 30년 가까이 교주로 재임했다. 그는 24년 3세 교주를 맡으면서 제2회 교의회를 소집하여 홍범규제의 개규(改規)를 통하여 새로운 대종교의 중흥을 도모했다.
그러나 1925년 삼시협약(三矢協約)의 부대조항(附帶條項)으로 인하여 대종교는 일대위기를 맞게 된다. 그 부대조항에 “대종교 주요 간부인 서일이 대한독립군의 수령으로서 그 교도들을 이끌고 일본에 항전하였으니 대종교는 곧 반동군단의 단체로서 종교를 가장한 항일단체이니 중국에서 영토책임상 이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의해 대종교 포교금지령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종교의 중심인물로서 대중국 외교통이었던 박찬익의 활약으로 1929년 포교금지가 풀렸지만 1931년 만주사변으로 또다시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애종사는 1934년 대종교선도회를 조직하여 포교와 항일활동을 계속하면서 1939년에는 대종교 교적간행위원회를 발족하여 2만권 가까운 교적을 간행했다.
그의 이러한 불굴의 활동에 힘입어 대종교의 교세가 식기는커녕 더욱 확산되자 일제는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적 본산을 대종교로 규정하고 이극로의 <널리 펴는 말>을 트집잡아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과 때를 같이해 단애종사를 비롯한 대종교 간부 25명을 국내와 만주·중국에서 동시에 검거하니 이것이 대종교의 임오교변(壬午敎變)이다. 임오교변이야말로 일제하 종교박해의 최대 사건이요 현대 한국정신사에 일대 각성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윤세복은 일제에 검거되어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대종교의 교리를 몸소 실천하여 증명한 수행자이기도 했다. 일제의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대종교의 경전인《삼일신고》<진리훈>에 나타나는 3법수행(三法修行)의 묘법을 몸소 체득하여《삼법회통(三法會通)》이라는 묘리(妙理)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삼법회통》은 지금도 수행·구도를 공부하려는 많은 후학들에게 좋은 귀감으로 회자된다.
- 3) 민족주의 양대 산맥이 모두 대종교인
- 대종교의 중광은 한국학의 중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 방면의 걸출한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그 대표적 분야가 국사와 국어부문을 들 수 있다.
우선 국사 분야를 본다면 한마디로 대종교의 중광과 함께 한국 민족주의사학이 체계화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날 불교중심적 사관이나 존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교중심적 사관에 유린당하던 도가적(道家的) 민족주의사관이 대종교의 중광과 더불어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종교가 중광한 시기인 1910년대 한국사 서술에서 그것을 주도한 대부분의 인물이 대종교도였으며 설사 대종교도가 아닌 역사가라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대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대종교도로서 언급할 수 있는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꼽는다면김교헌· 신채호(申采浩)· 박은식(朴殷植)· 이상룡(李相龍)· 유인식· 정인보(鄭寅普)· 안재홍·장도빈(張道斌) 등이다. 우선 한국 민족주의 사학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단재 신채호와 백암 박은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신채호는 1908년《독사신론(讀史新論)》을 발표하여 근대사학 확립이라는 명예를 안은 인물이다. “독사신론”이 비록 미완성 작품이지만 단군시대부터 발해시대까지의 근대 민족주의사학의 기본 골격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우리나라 근대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채호는 이러한 역사인식과 달리 사상적인 면에서는 유교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1910년 대종교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의 사학정신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낭가사상(郎家思想)과 일맥하는 선교(仙敎)에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그는 선(仙)을 불로장수를 추구하는 중국 도교의 이입으로 생각해 무가치한 종교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종교를 경험한 이후에는 중국 도교와 전혀 성격이 다른 우리 민족 고유의 선교가 이미 존재해 민족신앙의 중요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1910년 이후 신채호의 역사연구는 거의 대부분을 선교의 실체를 연구하는 데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10년 3월에 발표된 <동국고대선교고(東國古代仙敎考)>는 박은식의《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에 비견할 만큼 신채호의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과거 유교정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낭가사상이라는 역사정신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1913년 신채호는 당시 대종교의 중심인물로서 상하이에서 대종교 포교활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예관 신규식의 초청에 의해 상하이로 간다. 그곳에서 신규식·박은식과 더불어 대종교의 종립학교인 박달학원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한국사를 강의했다. 나아가 그는 1914년 윤세복의 초청으로 다시 봉천성 회인현으로 옮겨가 대종교에 입교함과 동시에 대종교의 종립학교였던 동창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조선사》를 집필했다고 하나 아쉽게도 전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대종교의 영향 속에서 신채호는 낭가와 낭가사상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조해 가면서 낭가사상의 국선·풍월도·풍류도의 기원을 한국상고사의 수두시대에 설정하고 그 의미 또한 중국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구별하였다. 이렇듯 신채호는 그의 민족사학의 변화과정과 사학정신의 바탕인 낭가사상 형성과정에서 대종교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편 박은식도 1910년 대종교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유교적 중화사관에 바탕을 둔 유교사상에 대한 절대적 옹호로 일관했다. 그런 이유로 고대사 인식에서도 단군의 의미조차 거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역(疆域) 문제에서도 반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1910년 이전의 그의 역사서술은 한마디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나타나는 역사인식보다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그가 1910년 경술국치를 계기로 대종교에 귀의하면서 국혼(國魂)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주의 사학자로 변신하게 된다. 1911년 만주 망명과 함께 대종교에 입교한 박은식은 그의 대표적 저술인《대동고대사론(大東古代史論)》과《몽배금태조》를 통해 민족과 역사의 공동운명 관계를 밝히면서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역사관을 고취했다.
- 4) 타 종교에서 개종한 지식인 많아
- 먼저 전자에서는 역사와 더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종교의 조종(祖宗)을 단군으로 밝히고 현재의 대종교가 이를 계승한 역사적 종교임을 천명했다. 후자는 나라가 망한 데 대한 준엄한 자기비판이 통곡처럼 흐르고 앞으로 나라를 되찾으려는 결의가 천둥처럼 울려퍼지는 통렬한 독립지침서이자 유교정신을 탈피하려는 박은식 자신에 대한 사상과 의식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 책이다.
박은식은 이 책의 저술 동기가 대종교의 절대적 영향임을 밝히면서 인간이 나라에 충성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육신의 고초는 잠시일 뿐이요, 영혼의 쾌락은 무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에 화를 주는 자는 육체의 쾌락은 잠시일 뿐이요, 영혼의 고초는 무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중화적(中華的) 가치 속에서 1천년을 흘러온 과거 노예의 역사를 통곡하면서 유교적 사대주의야말로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임을 밝혔다. 이렇듯 박은식의 정신주의사관의 배경에는 대종교라는 가치가 굳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종교와 연관된 인물들의 지극한 국어사랑의 정신 또한 대단했다. 먼저 ‘한글’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후일 ‘조선어학회’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주시경(周時經)은 배재학당을 졸업하면서 받은 예수교 세례를 과감히 버리고 대종교로 개종한다. 이러한 그의 대종교에 대한 능동적 선택은 당시 지식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던져졌다.
한마디로 그는 국어사랑의 바탕을 우리 민족정신의 뿌리인 단군신앙에서 찾고 언어민족주의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주시경 밑에서 한글 연구에 몰두했던 김두봉도 대종교의 핵심인물로 1916년 대종교 중광교조 홍암이 구월산에서 순명조천(殉命朝天)할 당시 홍암을 수행했던 6인 가운데 수석시자(首席侍者)였다.
한편 ‘조선어학회’를 사실상 이끌었던 이극로는 그가 가장 존경했다고 알려진 대종교 3세 교주 윤세복에게 감명받아 대종교에 입교한 인물이다. 그는 대종교에 입교하여 해방 후 월북하기 전까지 대종교의 주요 업무에 관여하면서 국어사랑운동을 실천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종교의 임오교변이 이극로의 ‘널리 펴는 글’에서 발단되었는데 ‘조선어학회사건’의 발단 또한 공교롭게도 이극로와 연관돼 있다. 즉, 윤세복이 만주 동경성에서 <단군성가(檀君聖歌)>를 작사하여 이극로에게 보내 작곡을 의뢰했다.
바로 이 가사가 어학회 사무실 이극로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면서 조선어학회사건의 빌미가 된 것이다. 대종교의 임오교변과 조선어학회사건은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최후 수단으로 우리 민족의 얼·말·글을 말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꾸민 일대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어학회 핵심인물들의 상당수가 대종교 인물들로서, 대종교의 원로들이 조선어학회가 대종교의 국내 비밀결사조직 역할을 담당했다고 증언함을 볼 때 두 사건의 필연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밖에도 민족의 정적(情的) 측면에서 대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현배(崔鉉培)나 대종교의 중심인물로서 한글사랑을 실천했던 정열모·정인보·안호상 등이 모두 대종교의 정신 속에서 우리 글을 갈고 닦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 5) 초대 내각 참여했다 곧 버림받아
- 끝으로 일제하 독립운동의 선봉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앞장섰던 대종교의 인물들 또한 화려하다. 먼저 상하이 임시정부의 산파역을 담당한 신규식은 대종교의 시교사 자격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민족의 부흥은 반드시 대종교가 발전하는 데 있다’는 신념 하에 박찬익·조성환· 유동열· 조완구·이상설 등 대종교의 중심인물들과 활발한 외교활동 및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만주 무장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 인물들로는 이동녕·현천묵· 계화· 윤정현·황학수· 김승학· 홍범도· 김혁· 김좌진· 윤복영·이범석· 여준· 이홍래· 정신·이동하· 한기욱 등이다.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종교인들이 무장독립운동의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다.
특히 무원 종사에 의해 주도된 <무오독립선언서>와 백포 종사가 총재로 대종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뭉친 북로군정서의 ‘청산리독립전쟁’의 승리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또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급 이상으로 참여했던 대종교 인물들을 보더라도 이시영·박은식·이동녕·신규식· 이상룡·조완구· 박찬익·조성환 등을 망라하여 20여명을 헤아린다.
한편 대종교의 임오교변 당시 순교한 백산 안희제는 대종교 정신을 토대로 민족경제를 몸소 실천·운용함은 물론, 대종교의 발전에 헌신하면서도 상하이 임정 독립자금의 상당량을 비밀리에 헌납한 인물이다.
이밖에도 조소앙(趙素昻)이나 안재홍(安在鴻)·안호상 등은 대종교의 교의(敎義)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하여 삼균주의(三均主義)·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 한백성주의(一民主義) 등의 논리로 발전시킨 인물들로 꼽힌다. 해방 후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구(金九) 선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종교 인사를 정부 요직에 끌어들였다. 건국내각에는 이시영 부통령을 비롯해 이범석(국무총리)·안호상(문교부장관)·명제세(심계원장)·정인보(감찰위원장)·신성모(국방부장관)씨 등 6명의 대종교인이 참가했다. 또 미군정 시절에는 안재홍 선생도 민정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약속했던 이승만은 집권 후 오히려 대종교와 임정 세력을 제거하고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권력지향적 마각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나 대종교의 인사들이 건국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국가가 더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대종교 중광(重光)과 독립운동 "포교는 곧 독립"
홍암 나철 대종사는 구한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자 국운을 바로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을사5적의 주살(誅殺)을 도모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그는 1909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1월15일) 대종교를 중광하기에 이르렀다. 대종교 중광과 더불어 항일 독립운동이 종단의 교운(敎運)을 건 급선의 실천과제로 뒤따랐다. 대종교의 항일정신은 중광 자체가 바로 항일독립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 과제였다. 항일정신은 바로 독립정신이며 나라를 구하고 동포를 건지려면 온겨레의 구심점을 국조 단군한배검으로 귀일시키는 것 이상의 명분이나 묘방묘책(妙方妙策)은 없었던 것이다. 대종교의 항일 독립정신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국조 숭배사상을 고취하며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 이념을 종단의 구현목표로 삼았다. 민족신앙의 교리(敎理) 안에 우리 민족사상과 민족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홍보했다.
- 만주로 망명하여 적극적인 무력항쟁으로 전환, 독립전쟁을 수행했다. 그곳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독립군 양성소를 만들고 청산리전투를 비롯해 벽오동·대전자전투 등 수많은 독립전쟁을 주도했다.
- 1918(戊午)년 음력 10월 개천절에 무오독립선언(대한독립선언서)을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 39인 명의로 선포했다. 무오독립선언은 무제한 무력투쟁을 선언한 데 비해 3·1독립선언은 평화적 항쟁을 선언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 포교활동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독립운동은 곧 포교활동이었다. 따라서 만주에서 40여 곳의 교당(敎堂)은 독립운동 기지화했다.
-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기 위한 민족교육학교를 설립했다. 이로써 신흥학교·동창학교·배달학교 등의 배움터가 만들어졌다.(광복 이후 홍익대학, 국학대학, 단국대학, 경희대학)
- 무력항쟁과 문화항쟁 양면작전으로 교육 및 문화운동을 전개해 만주에서의 민족학교, 국내에서의 교육계 중진을 배출했고 한글(언어)창달 운동을 벌였다. 일제의 언어말살정책에 맞서 조선어학회 조직 및 한글큰사전 편찬활동을 벌였다.
- 대종교의 항일 독립운동은 포교활동과 독립항쟁, 민족교육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루었다.
- 독립군 및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다.
- 국내에서 비밀결사를 통해 문화운동을 벌였다(교육자·국학자 및 각계 저명인사 포섭).
- 임오교변(壬午敎變)과 조선어학회사건: 1942년에 일제가 두가지 정책사건을 동시에 일으켰다. 조선어 말살정책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선민족정신 및 항일운동 핵심체 말살정책으로 임오교변을 일으켰다. 이때 10명의 대종교 지도자가 순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