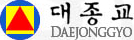역사인물
백암 박은식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8-09-03
- 첨부파일
민족사학자 백암 박은식 대형
박은식(1859~1925)
호는 겸곡(謙谷)·백암(白巖)·태백광노(太白狂奴) 등을 썼으며, 박기정(朴箕貞)이라는 이명으로도 활동했다.
일찍부터 신기영(申耆永)·정관섭(丁觀燮) 같은 정약용(丁若鏞)의 문인들과도 접촉하면서 그의 실학사상을 체득하였다. 26세를 전후하여서는 평안도 유림 거두 박문일(朴文一)·박문오(朴文五) 형제에게서 주자학을 본격적으로 사사하였다.
1898년 9월 장지연이 창간한 《황성신문》의 주필로 민중계몽에 나섰고, 만민공동회와 더불어 반봉건·반침략 투쟁을 벌이던 독립협회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 강사와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지내면서 교육개혁에 관한 글을 집필하여, 1904년 《학규신론(學規新論)》을 간행하는 한편, 서우학회(西友學會)를 발기하고 1908년 그 후신인 서북학회의 회장직을 맡기도 하였으며, 기관지 《서우》 《서북학회월보》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교육·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황성신문》이 복간되자 자리를 옮겨 10년 폐간될 때까지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하는 언론활동을 계속했다.
이 밖에도 그는 1909년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을 발표하여 유교개혁을 주장하고, 장지연 등과 대동교(大同敎)를 창건하여 종교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교계를 친일화하려는 일제의 공작에 대항하였다. 또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주창하기도 했으나, 1911년 대종교에 참여한 후로는 탈중화적인 민족주의 역사서술에 혼신을 기울였다.
특히 1911년 서간도 회인현(현재의 환인)으로 망명하여 윤세복과 더불어 국혼 사수를 위해 대종교를 이끌면서, 그 정신으로《대동고대사론》《동명성왕실기》《발해태조건국지》《천개소문전》《몽배금태조》등 여러 편의 사론을 집필하였다. 유명한《한국통사》와《한국독립운동지혈사》역시 이러한 정신의 연장에서 정리된 것이다.
1912년 상하이로 옮긴 그는 신규식(申圭植) 등과 함께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했고, 박달(博達)학원을 세워 교포자제를 교육했다. 1914년 잠시 홍콩에 머물다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국시일보(國是日報)》의 주간이 되었는데, 이때《안중근전》과《한국통사》를 지었다.
1915년 신규식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이 당의 취지서와 규칙을 작성,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또한 대동보국단(大同輔國團)을 조직하여 단장이 되었다. 1918년에는 러시아에서 한인교포 잡지《한족공보(韓族公報)》 발행에 관여하던 중 이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운동을 맞이하였다.
3·1운동 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의 기관지《독립신문》의 사장이 되었고, 1924년 임정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 1925년 3월 23일 이승만의 대통령 면직으로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임정은 독립운동의 이념·방법·지연·인맥 등의 파벌 암투로 내분을 겪고 있었다. 그는 독립운동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임정의 헌법을 개정, 대통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고치고 그 해 4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을 선임하고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11월 1일, 인후염이 악화되어 향년 67세로 이역에서 소원이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유촉만을 남기고 서거하였다.
- 이전글 ▲
- 무원(김교헌)종사
- 다음글 ▼
- 단재 신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