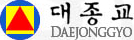|
금협산인(錦頰山人)·무애생(無涯生) 등의 필명을 썼으며, 호는 단재(丹齋)·일편단생(一片丹生)·단생(丹生) 등을 사용했다. 1897년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되었고 그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황성신문》에 논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듬해《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활약하였으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앙양에 힘썼다. 1907년 신민회와 국채보상운동 등에 가입·참가하고, 이듬해 순 한글《가정잡지》를 편집·발행하였다.
《대한협회보(大韓協會報)》또는《기호흥학회보(畿湖興學會報)》등에 논설을 발표하고 1909년 일진회(一進會) 성토에 앞장섰다. 1910년 4월 신민회 동지들과 협의 후 중국 칭다오[靑島]로 망명, 그곳에서 안창호·이갑 등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고 블라디보스톡로 건너가《권업신문(勸業新聞)》에서 활동하다가, 1914년 이 신문이 강제 폐간되자 그 해 남북 만주와 백두산 등 한국 민족의 고대 활동무대를 답사하였다. 1915년 상하이[上海]로 가서 신한청년회(新韓靑年會) 조직에 참가하고, 박달학원(博達學院)의 설립 운영에도 힘썼다.
1908년《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사학에 눈을 뜬 신채호는, 대종교를 만나면서 더욱 성숙된 민족주의사학자로 자리매김했다. 신채호 역사정신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낭가사상(郎家思想)의 형성 배경에는 대종교의 정신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대종교를 경험하기 이전의 신채호는 유교라는 정신적 바탕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신교(神敎)와 같은 맥락인 한국 고대선교(古代仙敎)에 대해서도, 불로장수를 추구하는 중국종교의 아류(亞流)로 공박했다.
신채호는 대종교를 경험하면서부터, 중국도교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우리 민족 고유의 선교가 이미 도교 수입 이전부터 형성되어 우리 민족신앙의 중요한 줄기가 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의식의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온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채호의 논문이 1910년 3월에 발표된〈동국고대선교고(東國古代仙敎考)〉인데, 그는 이 글에서 과거의 유교정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1910년대 이후의 신채호의 역사연구는 거의 대부분을 선교의 실체를 연구하는 데 두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사상적 바탕 위에서 대륙적 인식 및 문화사의 지평을 넓혀 간 것이다.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가, 의정원(議政院) 의원, 전원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나, 한성임정(漢城臨政) 정통론과 이승만 배척운동을 내세워 공직을 사퇴하고 주간지《신대한(新大韓)》을 창간하여 임시정부 기관지《독립신문》과 맞서기도 하였다. 그 후 비밀결사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단장, 신대한청년동맹(新大韓靑年同盟) 부단주(副團主) 등에 피선되었다. 1923년 민중의 폭력혁명으로 독립의 쟁취를 부르짖고 임시정부 창조파(創造派)의 주동역할을 하다가 다시 베이징[北京]으로 쫓겨가 다물단(多勿團)을 조직 지도했으며, 중국과 본국의 신문에 논설과 역사논문을 발표하였다.
1925년경부터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무정부주의에 주목했고, 1927년 신간회 발기인, 무정부주의 동방동맹(東方同盟)에 가입, 1928년 잡지《탈환》을 발간하고 동지들과 합의하여 외국환을 입수, 자금 조달차 타이완으로 가던 중 지룽항[基隆港]에서 피체 10년형을 선고받고 뤼순[旅順] 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옥사했다. 적과 타협없이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독립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 이와 같은 견해가 곧 그의 역사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고조선과 묘청의 난 등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역사라는 것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近代史學)의 기초를 확립했다.
저서에《조선상고사》·《조선상고문화사》·《(조선사연구초》·《조선사론》·《이탈리아건국삼걸전(建國三傑傳)》·《을지문덕전》·《이순신전》·《동국거걸(東國巨傑)》·《최도통전(崔都統傳)》등이 있다.
|